- 간편로그인으로 fno.vision을 경험해보세요!
- 로그인 / 회원가입
프랑스 연금개혁, 한국이 주목해야 할 건 그게 아닙니다만?
청년학생 칼럼니스트 이휘경
2023.04.11 16:04지금껏 최고의 연금 복지 국가였던 프랑스가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령 시기를 62세에서 64세로 늦추겠다는 결정을 밀어붙였고,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한창이다. 친구들과 여행을 간 릴에서도, 최근에 다녀온 낭트에서도, 폭죽 소리와 함께 시위가 있었으며, 파리 또한 이로 인한 진통으로 곳곳이 쓰레기장이다.
프랑스인 친구와 시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조정해야한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 더 오래 일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친구는 이렇게 되물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건 존경해. 그렇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퇴직 이후의 혜택을 누릴 기회가 부족해. 넌 현재의 퇴직 나이에 동의해?”
대답할 수 없었다. ‘65세’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거니와, 오래 일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여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연금 개혁 시위에서 숱하게 강조되는 것은 평안한 노년에 대한 ‘권리’다. 이와 같은 여론으로 프랑스에서의 연금개혁은 거센 시위를 일으킨 반면, 한국의 경우 언론이 나서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추세다. 초고령화,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낸 것마저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루머가 확산돼 국민연금 자체가 불안과 공포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 몸살 앓는 이유
왜 이렇게 다를까.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데, 왜 한쪽은 연금개혁에 거세게 반대하고, 한쪽은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발만 동동댈까. 애초부터 프랑스와 한국은 연금 제도가 딛고 있는 가치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이 놓여있는 상황 또한 다른 탓이다.
프랑스는 1945년 노동부장관을 지냈던 앙브루아즈 크로이자가 기초를 다잡은 사회보장 체계에 따라 연금 제도가 구축됐다. 그는 퇴직 이후 연금 수령을 통해 그동안의 노동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서 제도를 수립했고, 이 같은 체계는 연금 수령 자체가 중장년기까지 사회에 공헌한 대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중요한 복지 제도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이는 프랑스의 연금 개혁 시위가 한창인 지금, 프랑스 주요 언론사인 르몽드(Le Monde)를 비롯해 쿠히에 피카(Courrier Picard), 트히뷘 드 리옹(Tribune de Lyon)과 같은 지역신문까지 앙브루아즈가 추구했던 가치에 다시금 주목하는 이유다. 이들은 이미 연금 자체가 노년기의 보상적 의미라는 것과 그렇기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그만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왔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연금, 빈곤 탈출의 수단? vs 풍요로운 노년의 삶?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전 세계에서 연금 제도 자체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제도가 시행됐으며그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다.
당초 연금제도 도입의 시발점은 박정희 정권 아래 경제 개발이 가속화된 시점에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의도였다. 이런 기조를 비판했던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와서도 바로 도입되지 못하다가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핵가족화 확산으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책 마련 차원에서 겨우 그 틀이 구축됐다.
‘노년기의 빈곤을 막자’에서 출발한 연금 제도는 당연히 ‘노년기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자’에서 출발한 것과 같을 수 없다.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노인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금제도가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는 데에만 집중해온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년기’는 주요 노동 시기에 ‘기대되는 무언가’가 아닌, ‘빈곤에 처할 수도 있는 시기’로 여겨진다. 그래서 온 국민이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며, 열심히 일을 한다. 국가는 발 벗고 나서서 노동을 장려하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잊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이하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이미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너의 인생은 네가 알아서’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노년기는 우리의 삶의 일부다. 태어날 때부터, 노동하는 시기, 노년기까지 모두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추구하고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다. 제도 면에 있어 무엇이 맞다 틀리다 하기엔 모든 나라들이 서로 다른 역사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기초 위에서 세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불행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만들어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관이 옳은 것인지는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
단편적 접근 아닌, 국가의 역할과 책임 재고 계기 삼아야
프랑스 연금개혁을 △고령화를 앞둔 세계 △고갈되는 연금 예산 △정부와 노동자의 충돌 등 단편적으로 토막 내 바라봐서는 남의 집 불구경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어쩌면 고령화의 진정한 신호탄이 된 프랑스 연금개혁이 특히 우리나라에 가져다주는 시사점은 단순히 연금개혁을 통한 고령화 대응법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보다도 노년의 삶에 대한 관점을 다시 고민해볼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재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설명=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 앞에서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학생 칼럼니스트 이휘경
前 한대신문 편집국장칼럼니스트 자율유료구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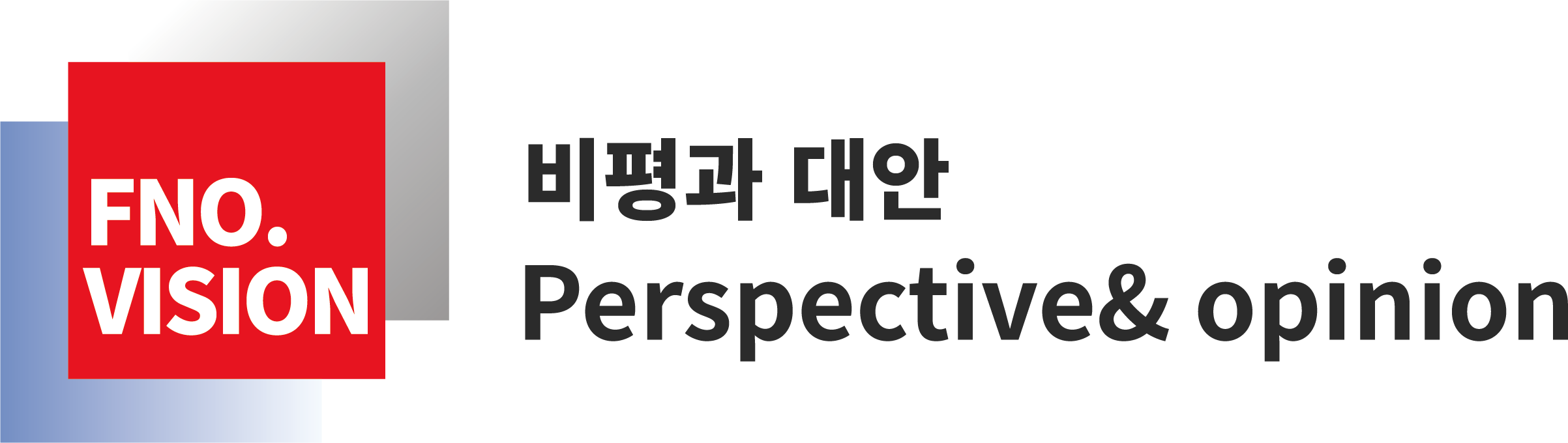


소통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