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로그인으로 fno.vision을 경험해보세요!
- 로그인 / 회원가입
제1부 탐구의 심성과 준수의 심성 1.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개인의 등장
전문위원 권희영
2023.09.26 10:08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개인의 등장
중세 유럽의 기독교는 종교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를 대표하는 로마 교황은 한편에서는 비잔틴 황제, 다른 한편에서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와 권력과 부를 사이에 놓고 우위를 경쟁하고 있었다. 중세 말에 이르러, 세속 국가들과 교회의 상호 협력과 지지로 지탱하던 중세의 질서는 무너지고 있었다. 사회는 치열한 긴장과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혼돈의 사태로 빠져들어갔다. 곳곳에서 농민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기독교 사회를 찾으려 하였다.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등에 의하여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토마스 뮌처(Thomas Muntzer, 1489-1525) 같이 기존 사회를 완전히 전복시키고자 하는 천년왕국주의자들도 있었다. 유럽의 종교개혁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종교개혁의 운동은 그 기원을 합리성에 기초한 탐구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의 비판적 연구
15세기 인문학자들은 신성이라는 선입견으로 무비판적으로 대했던 성경이나 교회 문서를 비판적인 태도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가장 선구적인 주자는 콘스탄틴 기증서(Donation Constantini)를 연구한 로렌초 발라(Lorenzo Valla, 1404-1457)였다. 기증서의 주 내용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와 제국의 서반부를 교황에게 기증한다는 것이었다. 문서에는 콘스탄틴 대제의 시기에 교황 실베스터 1세가 로마를 약탈하던 용으로부터 로마인을 구해내고 또한 콘스탄틴 대제의 문둥병을 세례의 성사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치유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교황에게 로마와 유럽 서반부를 기증했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13세기에 들어서 교황의 정치적 권위를 인증하는 문서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로렌초 발라는 콘스탄틴 기증서를 문헌학적으로 분석하여 이것이 위조된 것임을 밝혔다. 발라는 그외에도 원어(히브리어,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롬(Jerome)이 405년 번역한 라틴어 성경 불가타(vulgata)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도 또한 지적하였다. 가톨릭 교회가 정전으로 사용하는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큰 성과였다. 종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불가타의 오류를 지적한 것은 물론 교회에 도전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은 아니다. 단지 지식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이 교회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교조로 삼아 받아들이지 않고, 경험과 사실을 중시하면서 탐구적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이 유럽 사회로 널리 퍼져나갔다. 또한 유럽 인쇄 기술의 발달은 대중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하여 대중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발라의 비판 정신은 에라스무스와 루터에게로도 계승되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 종교의 자유
1466년 에라스무스(Erasmus of Rotterdam, 1466-1536)가 태어났다. 그는 신부의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당대에는 흔한 일이었다. 그는 성직자가 되어서 프랑스 북부 깡브레(Cambrai)의 대주교의 비서로 일하였고, 이후에는 파리의 몽떼귀 대학(clollege de Montiagu)와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하여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신약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는 박학다식의 연구자이자 작가였다. 또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5세의 정치고문을 하기도 했고, 교황 바오로3세로 부터는 추기경으로 추대되었다. 에라스무스는 또한 인기가 있는 작가였다. 1511년 츨판한 "우신예찬 In Prais of Folly"은 생전에 39판을 찍을 정도였다. 에라스무스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 했다.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의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성경에 직접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성경을 직접 읽고자 하는 열망은 강해졌고, 유럽 각국의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도 많이 보급되었다. 에라스무스는 또한 교리를 앞세우지 않고 개인의 판단을 중시하였다. 또한 성경 해석의 융통성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탐구를 권장하였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마련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에라스무스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루터는 행위를 구원받은 존재의 외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오로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된다(Justifictio sola fide)고 하였다. 루터는 당대의 성직자들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세속의 권력자들이 개혁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1520년에 "독일 국민의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reman Nation)"이라는 논문을 써서 종교개혁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루터는 또한 14세기 말 농민들의 봉기로 이루어지는 급진적인 혁명의 방식같은 위클리프의 종교개혁을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농민들의 무리에 반대하며(Against Mudering, Thieving Hordes of Peasants)" 논문에서 교회의 개혁을 영주들에 의존하려 하였다. 루터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개신교를 지지하는 세력이 확대되었고, 영주들은 1539년 슈말칼덴 동맹(Schmalkaldic League)을 맺어서 가톨릭 세력으로부터 루터파 교회를 보호하기로 하였다.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
신성로마제국은 독일의 통일을 위하여 가톨릭과 개신교를 타협케하고자 했지만 그 과제는 쉽지 않았다. 황제 카를5세가 신구교 사이의 타협을 위하여 공의회를 소집하려 했지만 이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개신교 내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스위스의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가 면죄부의 해악을 고발하였다가 가톨릭 측에 의하여 살해되었는데, 뒤를 이은 장 칼벵(Jean Calvin, 1509-1564)은 제네바에 근거를 두고 구원과 정죄의 예정론을 주장하고 신정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유럽의 기독교는 가톨릭, 루터파, 칼벵파로 갈리고 그외에도 40여개의 종파가 있게 되었다. 기독교의 각 파들은 계속 싸우다 결국은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평화 회의에서 "한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의 영주가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합의하였다. 개인의 종교적 자유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우구스부르크신앙고백(Augusburg Confession)을 통하여 개신교 개혁의 대강을 마련하게 되었다(1530.6.25). 이 신앙고백의 11조는 "비록 어떤 신자가, 사람이 용서받아야 할 죄를 모두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죄 모두를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루터파는 개인적인 사면은 교회 내에 있다고 믿는다"라 하였다. 획기적인 개인 의식의 발전인 것이다.
트렌토 공의회와 교육의 확대
분열된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1545년 트렌토 공의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분열된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각 교회는 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1565년 교항 피우스5세(Pius V)는 성직매매를 처벌하고, 신학교를 세워 주교들을 교육하였다. 밀라노의 대주교를 역임한 카를로 보로메오(Carlo Boromeo)는 교구에 신학교를 세워서 성직자를 대상으로 한 근대적 방식의 교육을 하였다. 가톨릭이 개신교에 대응하면서 가톨릭을 재건하려는 운동도 일어났다. 로욜라(Ignatus Loyola)는 예수회를 설립하고 교회에 절대 복종을 하는 개혁을 하고자 했다. 예수회는 교황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고 유럽 및 식민지에서 활동하는 자유를 받았다. 예수회는 상류계층을 교육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수회는 동아시아 까지 진출하여 선교를 하고 서양의 문명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종교와 과학
17세기 말 영국의 내전이 종식되면서 왕립협회(Royal society)는 종교와 과학을 학문적으로 부흥시키려 하였다. 1660년 영국은 지식인들의 협회를 구성했는데, 공식적 명칭은 '자연의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런던의 왕립협회'였다. 왕립협회는 왕실의 승인과 후원을 받았고, 세계 최초의 과학 아카데미가 되었다.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이었지만 순순하게 학문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뉴튼(Issac Newton) 역시 이 협회에 참여하였다. 그는 과학적 탐구를 통하여 종교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교와 과학의 거리는 멀어져갔다. 이로써 종교는 과학과 결별하게 되었고, 영국에서는 국교회가 성립되어 교황의 정치와도 결별하였다. 이제 자연은 이성이 확인할 수 있는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이 서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 뿌리를 내렸다. 이후로, 기독교 합리주의자들은 신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믿음을 미신이나 광신으로 여기게 되었다. 근대적 사고의 세계로 넘어온 것이다.
존 로크와 합리적 기독교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중세적 신앙과 결별한 대표적 사람이었다. 그는 중산층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의 학생이었고, 로버트 보일과 함께 화학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는 의사가 되었고, 정치계와 공직에도 참여하였다. 그는 "인간오성론(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691)"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여기에서 그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증거가 말해주고 있는 것 이상은 절대 받아들이지 읺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로크는 신앙에 있어서도 교리가 아닌 도덕에 주목하였다. 도덕의 기초는 "하나님의 의지와 법"이고 이는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곧 상업의 논리를 활용한 것이며, 합리적인 기독교 신앙인 것이다. 중세에 사람들을 떨게 하였던 지옥에 대한 믿음은 현저히 약화되었고 18세기의 기독교는 감성을 배제하면서 형식과 제도를 강조하는 것이 되었다.
정교분리와 계몽주의
베스트팔리아 조약(Westphalia Treaty,1648)은 교황에게는 대재앙이었다. 국제 문제에 교황이 개입할 여지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 교황은 무력해지고 교황의 친위대 역할을 했던 예수회(Jesuit Order)도 지속되기가 어려워졌다. 예수회는 포르투갈에서 추방되었고, 1764년에는 프랑스, 3년 후에는 스페인과 자치령에서 추방되었다. 클레멘스 14세는 교서를 통해 예수회를 해산했다(1773). 이후로 성직자들의 훈련은 세속 정부의 통제에 놓이게 되었다. 계몽주의자를 자처한 국왕들이 단행한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한 결과였다. 이로써 중세에 유럽을 지배했던 기독교 세계는 사라졌다. 그대신 근대적 세속 국가들의 세계가 등장하였다.
1820-30년대에 독일에서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흐(Friedlich Schleiermacher, 1768-1834)는 기독교 신앙을 재평가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르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사적 인식의 총합"이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이라고 하였다. 이는 에라스무스와 로크를 계승한 최소신학(minimum theology)의 전통이었다. 개인성의 발견과 탐구의 정신이 갖게 된 근대의 면류관이었다.
(사진 설명)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을 로마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면서 서기 330년에 세운 기념탑
전문위원 권희영
1989-2021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연관칼럼
칼럼니스트 자율유료구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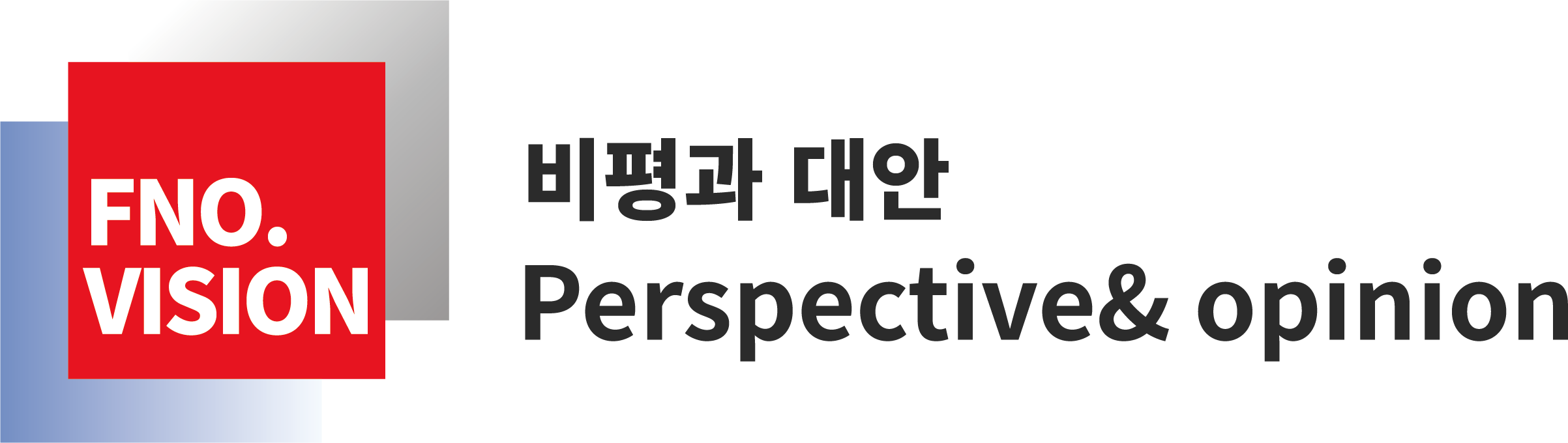


소통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