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로그인으로 fno.vision을 경험해보세요!
- 로그인 / 회원가입
비옥한 우크라이나 농지 점령한 미국기업들
전문위원 이상현
2025.02.05 15:52미국 정가에서는 “미국의 금융그룹만 살 찌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베트남 전쟁 확전에 반대했다가 피살된 존 F. 케네디의 조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이하 케네디)가 대표적이다. 그는 트럼프 2기 내각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다.
케네디는 “전쟁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농지 30%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지배하는 다국적 농업기업 듀퐁과 카길, 몬산토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농지의 절반이 헐값에 다국적 미국 기업에 넘어갔다”는 소문을 구체적으로 전한 것이다. 소문의 진원지는 2023년 불가리아의 한 국회의원. 그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그해 11월 한 현지 언론사가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우크라이나 법률상 외국인은 농지를 구매할 수 없다. 블랙록은 전쟁 첫해인 2022년 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선언했다. 하지만 몇 달 뒤 이런 소문이 돌자 즉각 전면 부인했다. 이후 불편한 진실을 다루지 않은 서방 언론들의 의도적인 무시로 2024년까지 공론화 되지 못했다. 케네디는 “이 농지를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젊은이 50만 명이 죽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유럽 전체 농지의 3분의 1 차지하는 비옥한 흑토
우크라이나의 흑토는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비옥하다. 이 지역에서 재배된 옥수수 생산량은 세계 3위, 밀 생산량은 5위에 이른다. 실제 경작 가능한 농지 3300만㏊(헥타르·1㏊는 1만㎡)는 유럽 전체 농지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 붕괴로 농지를 농부들에게 나눠주면서 매매를 금지시켰다. 이는 2021년까지 지속됐다.
2021년 7월 국제기구의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거래 자율화를 시행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내국인 개인간 농지 거래를 100헥타르에 한해 허용했다. 국제기구는 다름 아닌 국제통화기금(IMF). 미국이 통제하는 IMF가 왜 우크라이나에게 토지거래 자유를 종용했는지, 그 이유는 2024년 1월 드러난다. 이때부터 우크라이나 내국 법인에게도 1만 헥타르 한도로 토지 매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외국인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49년 장기임대 방식을 이용하면 ‘거저먹기’다. 이미 2014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만 190만 헥타르가 외국인 거대 기업에 임대됐다. 사실상 소유권이나 다름없는 이 임차권은 매매에 들어가는 대규모 자금을 아낄 수 있으며, 큰 문제가 없으면 계약 갱신 우선권도 있어 손쉬운 농지 확보 방법이다. 2014년 당시 우크라이나 농업 부문 10대 기업은 280만 헥타르를 이런 방식으로 확보했다.
장기임대 받거나 내국법인 지분 매입해 사실상 소유
다른 방법도 있다. 외국인이 우크라이나 내국 법인 주식을 매집, 지배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이 우크라이나 농지를 사실상 소유할 수 있다. 토지를 농부들에게 나눠줬지만 알짜 땅은 대부분 우크르란드 파밍(UkrLandFarming)의 대주주 올렉 바흐마축 등 소수의 올리가르히(독점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있다. 올리가르히들이 보유한 대농장의 지분을 외국기업이 구매하는 식이다. 가령 우크라이나 농업 대기업집단 중 1위인 케르넬 홀딩스(Kernel holdings)는 오너인 안드레이 베렙스키가 지배하는 남센(Namsen Limited)이 지분 42.6%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지분은 모두 해외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1위 농업기업집단 지주회사의 지분 57.4%를 보유한 다른 주주들 중에는 미국 기업 4개사가 포함돼 있다. 다국적 농업기업 카길도 2014년 1월 우크라이나가 마이단 혁명으로 한창 어지러울 때 2위 기업 우크르란드 파밍 지분 5%를 2억 달러에 매입했다.
종자, 비료, 창고사업에 진출…사실상 현지농업 지배
또 다른 세 번째 방법은 농지 외에 종자, 비료, 저장고까지 농업의 필수적인 부대 사업에 진출하는 것. 몬산토와 카길, 듀퐁 등 다국적 농업회사들이 이런 방식에서 단연 독보적이다. 외국기업에 대한 장기 임대가 허용된 직후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이 세 기업은 파죽지세로 현지에 달러를 풀었다. 몬산토는 2012년에 현지 사업 규모를 2배로 키웠고, 유로마이단 쿠데타가 매듭지워진 직후인 2014년 3월 1억4000만 달러를 새로운 종자 플랜트 건설에 투자했다.
미국의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와 번지(Bunge), 카길(Cargill), 프랑스의 루이드레퓌스컴퍼니(LDC)는 세계 곡물시장의 80%를 장악한 4대 곡물기업(ABCD)으로 꼽힌다. 이 중 미국 ABC 3사는 우크라이나 곡물 보관과 처리 설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카길은 우크라이나에 4개의 곡물 엘리베이터, 2개의 해바라기씨 처리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다. 2013년 350만 톤 규모의 곡물 처리가 가능한 흑해 연안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구 곡물터미널 지분 25%와 1%의 황금주를 매입했다.
직접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외국인 기업이 우크라이나 농지와 농업에 엄청난 경제적 지분을 가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여기에 구제금융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농업기업들의 목줄을 쥐게 된 IMF와 세계은행(IBRD)은 서방 기업이 진출하기 쉽도록 토지자율화를 금융조건에 강제했다.
우크라이나 농업기업 대주주는 미국 대기업
우크라이나 5위 농업기업인 NCH 캐피탈의 경우, 미국의 제네럴일렉트릭(GE)・다우케미컬・록히드마틴 연금시스템, 하버드대학 등 미국 기업들이 지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NCH 캐피탈의 최고경영자(CEO) 조지 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하는 정부 대표단에 포함돼 미국 상무부와의 지원 회의에 참가했다. IMF의 10억 달러 대출을 받아내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대출을 받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토지시장 자율화를 대출 조건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민간 차원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헐값에 농지를 임대했다. 2012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밀리에 40만 헥타르 정도를 2억 달러 투자 조건으로 장기 임대하려는 계획이 노출된 적도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대통령 재직 당시 한 TV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30년 동안 500만 헥타르의 농지를 도둑 맞았다”며 분노한 적도 있다. 모두 합치면 전체 농지의 28%에 해당하는 900만 헥타르(9만㎢)가 외국인에게 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국민 여론 무시…서방언론 ‘적반하장’
우크라이나 국민 65.5%가 2021년과 2024년 시행된 토지 자유화 정책에 반대했다. 외국인에게까지 농지 거래를 허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재정 파탄에 이른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국민의 뜻을 수용할 힘이 전혀 없었다. 더욱 엄밀히 말하자면 마이단 혁명 이후 집권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깔아준 판 위에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이기에 되돌릴 의지가 없다는 편이 진실에 가깝다. 특히 여러 개인적 치부 의혹을 받고 있는 젤렌스키 집권이기에 대다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난망 그 자체다.
이러한 명백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국내 언론이 전하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이라고는 서방 언론 받아쓰기를 통해 ‘러시아 악마와’에만 머물고 있다. 한국 통신사 <뉴시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2022년 12월6일치 기사를 번역해 소개하면서 “알렉산더 카쵸프 전 러시아연방 농업부 장관 소유의 러시아 농업기업이 우크라이나 농지를 빼앗았다”고 보도했다. 카쵸프 전 장관이 대주주인 러시아 농업회사 카쵸프 아그로컴플렉스(Tkachev Agrocomplex)가 같은 해 9월 주민투표를 거쳐 러시아연방에 편입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소재 농지 약 1600㎢를 매수한 사실을 소개한 외신기사를 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카쵸프 아그로컴플렉스는 러시아 최대 농경지 소유 기업이다. 러시아 농지정책에 따라 개인이든 법인이든 연방 내 모든 농업용 토지 를 매입할 수 있다.
미국 언론은 자국 최대 농업기업들이 전쟁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농지 30%를 사실상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사진=로이터 연합) 트럼프 2기 내각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농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 이상현
스푸트니크 한국특파원칼럼니스트 자율유료구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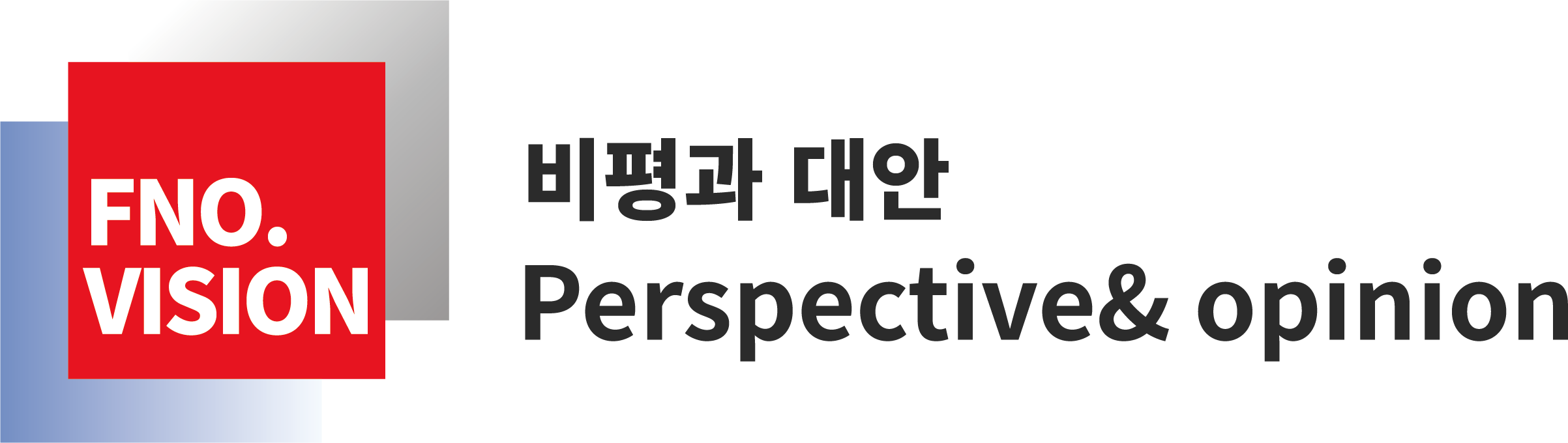


소통 커뮤니티